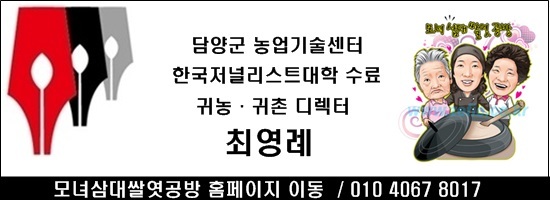불법으로 변하는 '전통음식' 위생적이지 않다?
울며 겨자먹기식!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조장
수억원대 개선비용 엄두 못내 영업중단도...
'전통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시설기준 필요!

쌀엿은 명절이나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친지, 이웃과 주고받았던 이 지역의 미풍양속에 비롯됐다지만 명품 엿으로, 지역 특산품의 반열에 오른 것은 한 사람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인고의 시간과 정성을 더 해 전통의 맛을 지켜온 이들만이 거머쥘 수 있는 값진 쌀엿인 것이다.
하지만 팔 수 있는 엿을 만들어 내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쌀엿은 설탕이나 물엿, 감미료 등은 일체 넣지 않고 오로지 질 좋은 쌀과 엿기름만으로 맛을 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 무엇보다 엿의 맛은 어떤 엿기름을 사용했느냐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녀삼대쌀엿공방'은 엿기름을 직접 만들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가 농한기나 집안 행사 때마다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엿을 만드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보고 자랐고, 최영례씨의 어머니 역시 솜씨가 좋았던 만큼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팔 수 있는 엿을 만들어 내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외할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 먹었던 그 맛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 힘든과정을 거쳤다.
제조허가를 내기위해 시설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 강화된 위생법으로 인해 시설을 개선하라니 울며 겨자먹기로 하긴 했는데, 최영례씨는 “돈도 돈이지만 외할머니부터 내려온 부뚜막의 '전통적인 모습'이 크게 훼손됐다." 며 아쉬워했다.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 여력이 없는 영세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전통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시설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지않은 전통업체가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지키지 못해 '위법업체'가 될 위기에 처했다.
문을 아에 닫은 사례도 있다. 역사를 자랑하던 전남 창평 유촌마을이 그 중 하나다. 유촌마을 할머니들은 가정집에서 만든 엿이 입소문 나서 판매까지 하게 된 곳이다.
그러나 판매를 하려면 사업자등록과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허가를 받으려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준에 맞추려면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수준으로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돈도 없는 꼬부랑 할머니들에게 그저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고령으로 영업중단도 하였지만 이러한 복잡한 법에 의해 중단한 곳도 있다고 한다.
최영례씨는 “시골에서 엿공방을 운영하면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 법이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호소할 여력도 안 된다.” 꼭 해결됐으면 규제라고 말했다.
음식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게 맞다. 허나, 식품위생법이라는 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위생법 때문에 판매 같은 쪽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농산물 식품가공법도 개선된 만큼 '전통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시설기준법이 유연하게 쫓아와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